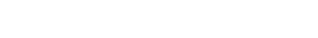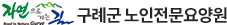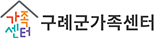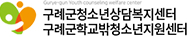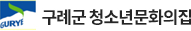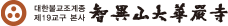화엄사 이 탑 앞에 서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람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7-11 12:37 조회2,026회 댓글0건본문
화엄사 이 탑 앞에 서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요
백팔계단 오르면 나오는 효대에서 그리워지는 어머니
 |
| ▲ 구례 화엄사 여름의 황매화 |
| ⓒ 이완우 |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 150여 명이 전남 구례의 화엄사와 천은사를 차례로 찾아서 문화관광 해설 현장 실습을 했다. 전북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는 이날 현장 실습에 참여해 오전에는 천은사를 탐방하고 오후에는 화엄사를 탐방했다.
단청 없이 수수한 화엄사의 각황전은 이른 봄 황매화가 필 때면 화려하게 단장된다. 화엄사 가람에 시주할 재물이 없어 애태웠던 가난한 할머니의 마음일까? 언제나 위태로운 왕자를 보며 애태워하며 이곳 가람에 큰 시주를 한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의 마음일까? 각황전 홍매화는 해마다 봄이면 또 간절하게 피어날 것이다. 7월 초순의 황매화는 온통 초록색으로 무성했다.
만여 점 파편으로 남은 돌로된 경전
 |
| ▲ 화엄사 각황전 |
| ⓒ 이완우 |
각황전의 옛 이름은 장경각이다. 장경각의 전벽(殿壁)은 흙벽이 아니고 화엄경을 새긴 청석(靑石)을 벽돌처럼 귀를 맞추어 쌓았다. 정유재란 때 장격각이 불타고 소중한 유물인 벽경(壁經)도 파괴되고 말았다. 만 수천 점이 넘은 돌조각 파편으로 남은 장경각 석경(石經)은 화엄사의 상징적 유물로,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국토를 순례했던 시조 시인 노산 이은상(1903~1982) 선생은 1938년에 지리산을 탐방했다. 그는 화엄사에 들러서 장경각 석경 파편을 보았는데, 범어(梵語) 조각까지 있었다고 한다. 석경 조각을 예찬한 그의 시조는 안타까움과 감격이 가득하였다.
화엄경 경벽(經壁)도 무상하여 깨어졌네
깨어진 조각돌을 손에 들고 읽으오매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 적혔구나.
종이에 쓴 경(經)은 불나면 타버리고
돌에 새긴 경(經)은 비바람에 부서져도
마음에 박은 경전은 사라질 줄 모르나니.
획마다 글자마다 금금이 소리있어
점 하나 남김없이 다 삭아 없어져도
알뜰한 임의 마음은 천추만세전(千秋萬世傳)하리라
 |
| ▲ 화엄사 효대 백팔계단 |
| ⓒ 이완우 |
각황전을 왼쪽으로 돌아서 효대(孝臺)로 오르는 언덕 길,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계단에 올라섰다. 하늘색 수국이 소담스럽게 피었다. 여름 무더위에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도 제법 발걸음이 무거웠다. 언덕 아래 가까이 각황전 지붕이 보인다.
언덕 위 아담한 마당에 3층 탑신 형태의 사사자삼층석탑이 서 있다. 탑신은 네 마리의 사자가 네 모퉁이에서 기둥 역할을 하며 떠받치는 독창적인 구조이다. 사자들에 에워싸인 기단 중앙에 합장한 채 서 있는 비구니 상이 있는데, 연기 존자의 어머니라고 전한다. 석탑 앞에는 작은 석등이 있다. 석등의 기단부 세 기둥 사이 공간에 연기 존자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고 있다. 이 두 석탑과 석등을 사리탑과 공양탑이라고도 한다.
 |
| ▲ 화엄사 효대 |
| ⓒ 이완우 |
오른쪽 어깨가 석탑과 석등을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돌았다. 동백나무 잎이 햇빛에 반짝이고, 지리산 연봉 위로 하늘에 흰구름이 한가롭다. 이은상 선생은 이곳 효대에서도 시조를 남겼다.
일유봉은 해 뜨는 곳, 월유봉은 달 뜨는 곳
동백나무 우거진 숲을 울삼아 둘러치고
네 사자 호위 받으며 웃고 서 계신 저 어머니
천년을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여쁜 아드님이 바치시는 공양이라
효대에 눈물 어린 채 웃고 계신 저 어머니
그리워 나도 여기 합장하고 같이 서서
저 어머니 아들 되어 몇 번이나 절하옵고
우러러 다시 보오매 웃고 서 계신 저 어머니!
시조를 읊으니, 마음이 아련히 아파진다.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 효대의 사리탑과 공양탑 석상에 새겨진 어머니와 아들의 표정도 살아있듯 생생했을 터인데 이제는 표정이 없다. 천년 세월이 지나서 풍화와 박리 현상으로 석조 부재의 표면이 흘러내렸다.
 |
| ▲ 화엄사 효대 |
| ⓒ 이완우 |
고려 시대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이 이곳 백팔계단을 올라 효대 언덕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寂滅堂前多勝景 적멸당전다승경
吉祥峰上絶纖埃 길상봉상절섬애
彷徨盡日思前事 방황진일사전사
簿暮悲風起孝臺 부모비풍기효대
적멸당 앞에 (지리산의) 멋진 경치 에둘렀고,
길상봉(노고단) 위 (하늘은) 티끌마저 없이 맑다.
(이리저리) 하루해가 저물도록 서성이며 지난 일 생각하는데,
저물녘에 애달픈 바람이 효대에서 불어온다.
효대 앞의 지리산 풍경은 맑고 아름다운데, 하루 종일 옛일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슬픈 감회에 젖는다는 내용이다. 스님은 아침 나절에 이 효대에 올라서 종일토록 서성인 듯하다. 어느덧 저녁 어스름에 이르렀다. 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고, 스님의 마음에는 애달픈 바람이 일었다.
스님이 되어 출가한 아들을 잊지 못해 비구니가 되어 아들에게 공양하며 아들의 견성성불을 자나 깨나 염원했던 어머니. 이 한시를 음미하다 보면, 스님은 공양상을 어머니로 보고 시를 읊었음을 알게 된다.
 |
| ▲ 화엄사 효대 |
| ⓒ 이완우 |
어머니로부터 하직하고 세상을 떠나 출가한 수행자들이 이 효대에 오르면 누구나 어머니를 회상하며 잠시라도 방황하게 될 것이다. 화엄사 효대는 이곳 도량에서 가장 인간적인 정서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쉽게 이 효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스스로 불효자로 여기기 마련이다. 화엄사 효대 앞에 서면 자애로운 부모님의 사랑에 마음이 아려온다. 어머니의 희생과 자애로움에는 마음에 슬픈 바람이 불고, 눈시울까지 적셔진다. 기자도 효대 앞에서 불효를 오래도록 참회하는 불효대가 되었다.
화엄 사상은 연기(緣起)가 핵심이다. 모든 사물도 그 어느 하나 홀로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서로의 원인이다. 연기를 인연으로 단순화하면, 연기의 처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화엄사 효대는 화엄 불교의 심인(心印)이며 심경(心經)이지 않을까?
효대는 화엄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화엄사 가람을 내려다보며 효 사상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었다. 그 어느 사찰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를 이만큼 지극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무너지지 않으니 마음에 새긴 경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화엄경을 돌에 새긴 각황전(장경각)의 석경이 복원되면, 화엄사의 심경이라고 여길 수 있는 효대와 함께 천 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
| ▲ 화엄사 효대 |
| ⓒ 이완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